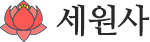글모음집
멋쟁이와 멋진사람
멋쟁이와 멋진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사람마다 보는 시각과 느낌에 따라 다르지만
나의 견해로 본다면 멋쟁이는 외형적 감각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센스 있는 사람이다. 멋진 사람은 멋쟁이 플러스 행동과 마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행동이 훌륭하다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에 익혀져 나오는 인품이 주는 품격이다.
그 사람 ‘멋쟁이야’ 표현은 누구 나다 쉽게 표현 하지만 그 사람 ‘멋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리 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외형과 인품이 두루 갖추어진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내가 멋지지 않으면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곁에 멋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멋지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멋짐의 품위는 달라 질수가 있다.
남도에 매화꽃이 수없이 피고 있던 봄날, 내소사 지장암 차실에서 나는 멋진 사람을 만났다.
“고요한 달밤에 거문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손에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구태여 줄을 골라 곡조를 아니 들어도 좋다./맑은 새벽에 외로이 앉아 향을 사르고 산창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불경을 아니 외워도 좋다/ 봄 다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문하고 귀촉도 울음을 귀에 담는 시인이라면 구태여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라도 좋다./아침 일찍 세수한 물로 화분을 적시며 난초 잎에 손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도 좋다./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랑을 베개하고
바위에서 한가히 잠든 스님을 보거든 아예 도(道)라는 속된 말을 묻지 않아도 좋다./
야점사양(野店斜陽)에 길가다 술을 사는 사람을 만나거든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다정히 인사하고 아예 가고 오는 세상 시름일랑 묻지 않아도 좋다./
차실 족자 안에 담겨 있는 해안선사의 글 ‘멋진 사람’의 내용이다.
살아생전 뵙지 못한 스님이지만 족자에 담긴 글 한편을 읽어 내리면서 얼마나 담백한 삶을 살아오신 분인지 얼마나 멋진 맛을 아시는 분인지 감히 짐작을 해본다.
차실 곳곳에 느껴지는 선배스님의 뛰어난 예능적 감각은 이 시를 더 곱씹게 하였다. 시가 차실이 아닌 대중 방이나 선배스님의 방에 걸려 있었다면 품위 있는 글 보다는 큰 스님이 주신 법문으로 새길 질도 모르는 것이다.
다지고 털어내고 그 반복이 수없이 이루어졌을 때 사물을 바라보는 느낌, 시선은 맑고 향기롭다. 그 향기로움을 공유하자고 시인은 시를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연주자는 악기를 다루며 제 각기 표현을 한다. 평범한 정서가 아닌 아주 절제되고 정화된 정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린 음악, 그림, 시에 감동을 받고 그 내용 속에 공감을 얻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을 우린 예술이라 한다. 그 예술은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손짓 몸짓 하나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일상의 표정이 예술인 셈이다.
즉 살아 있는 삶 자체가 예술적인 값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봄 날 차실에서 팽주가 따라주는 생매화차 꽃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것은 봄 다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문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살아가면서 이런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굳이 도(道)를 논하지 않아도 한편의 시를
거든히 건지지 않을까 싶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